QUICK
과월호 보기
‘기억의 감옥’에 갇힌 이들-<5일의 마중>(2014)
과월호 보기 최 은(영화 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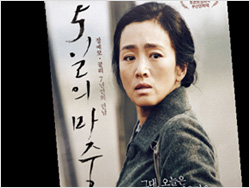
“이달 5일에 돌아가오.” 문화대혁명의 끝자락, 끌려갔던 남편 루옌스(진도명)가 석방을 앞두고 편지를 보내왔다. 그때부터 아내 펑완위(공리)는 매달 5일, 남편의 이름을 크게 쓴 피켓을 들고 역에 마중을 간다. 문제는 이미 루옌스가 돌아왔는데도 그런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부터 심인성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잊었다. 유독 남편의 얼굴만 말이다.
3년 전, 루옌스는 수용소를 탈출했었다. 무용학교에 다니던 딸 단단(장혜문)은 이 일로 공연의 주연 자리를 빼앗겨 원망과 분노로 아버지를 밀고했고, 딸의 철없는 행동에 분노한 펑완위는 단단을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돌아왔지만 펑완위는 그를 공안 요원 ‘팡씨’라는 인물과 착각하며 자꾸 문밖으로 내친다.
장예모 감독의 <5일의 마중>은 가장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가장 큰 공포로 기억(또는 망각)되고, 모든 것을 잊었으나 딸의 부끄러운 실수는 잊지 못하는 아내의 고통을 다룬 영화다. 또한 아내가 기다리는 (과거의) 자신과 아내 곁에 있는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매번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엉거주춤 머물러 있는 죄인 된 남편의 이야기이고, 관찰자이자 희생자였으나 어느덧 가해자가 돼 ‘추방된’ 어린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들의 고통은 하나의 고리를 이루면서도 타자를 향해 그 끝을 열어 놓았다. 공안 요원 팡씨가 그중 하나다. 그에게 복수하러 갔던 루옌스는 팡에게도 그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음을 보고 말없이 돌아선다.
『기억의 일곱 가지 죄악』의 저자이자 신경과학자 대니얼 L. 샥터는 고통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 “기억의 감옥에 갇힌 비극적 죄수들”이라고 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뭉클하고도 날카롭다. 늙은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그 곁에는 남편이 자신의 이름이 쓰인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닫힌 철문 뒤로 카메라마저 물러나면서 노부부는 이윽고 문창살에 의해 분할된 프레임 속에 갇힌다. 누가 그들을 꺼내줄 수 있을까? 적어도 그들 스스로의 몫은 아니다. 고통의 고리로 맺어진 공동체가 ‘수인(囚人)’들을 품는다. 그들이 곧 모두를 위로할 바른 기록(역사)을 남길 것이다.

 구독가이드
구독가이드 정기구독
정기구독 날샘 App
날샘 App